Home / 시론/칼럼
[칼럼] 시(詩)와 간호, 치유의 길을 말하다
김성리 인제대 인문의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간호사
기사입력 2014-08-26 오전 11:0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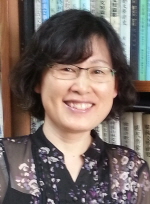
◇마음의 고통 치유하는 방법 시와 간호 서로 많이 닮았다
◇시를 읽고 써보는 경험 통해 삶의 매듭 풀어내고 자기실현
시를 통해 우리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시와 간호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시와 간호는 둘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삶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
시는 체험으로부터 생기는 고통과 문제들을 성찰과 관조 그리고 독백이라는 특유의 대화로 치유해 나간다.
간호(看護)는 몸이 아픈 사람을 `관찰하여 돕거나 보호'함으로써 치유에 이르도록 돕는다. 따라서 간호는 `양생(養生)'의 행위이다. `양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태어남(생명)을 기르다'이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위이며, 이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사랑'이 뒤따른다.
몸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들을 남기기도 한다. 몸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삶의 문제는 가면을 바꾸어 가며 우리들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며시 왔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기도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 전에 몸의 문제로 인해 자아를 상실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채지도 못했다.
20대의 전부를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으로 그리고 간호사로 지내면서 나는 병들어 스러져가는 이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장애로 불편해진 그들의 일상을 염려했다. 그러나 균형이 사라진 그들 몸의 변화만 보았지 그 몸속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
구멍 뚫린 그들의 마음이 보인 것은 시를 공부하면서부터이다. 무려 20여 년이 지나서야 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전이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 외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능력 있는 간호사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좋은 간호사는 아니었던 셈이다.
늦은 나이에 시를 공부하면서 시가 어쩌면 우리들 삶의 문제를 어루만져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센인 할머니를 찾아갔다.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일그러지는 몸으로 인하여 삶을 빼앗긴 한 여인,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든한 살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열아홉 살의 소녀를 만났다. 그녀의 빛나는 사랑과 가슴 가득 고여 있는 그리움이 11편의 시로 형상화될 때 피어나는 아우라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와의 만남을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서 그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할머니의 깊은 슬픔을 보았다. `꽃보다 붉은 울음'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할머니의 슬픔의 색깔이기도 하고, 언제나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는 내 마음이기도 하다.
오래 전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떠난 사람, 몹쓸 병과 싸우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사람, 평생 두 발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리라. “몸이 아픈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말해주리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간호하며 느끼는 고독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간호사들의 시를 읽으며, 때로는 “도심 한가운데 두리번거리며(〈52W-1〉, 김진호)” 갈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굴욕과 능욕을 속싸개처럼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 켜켜이 껴안고 있는 포근함(〈그런 것〉, 서효경)”이 있는 길이 간호사의 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센인 할머니가 시를 통해 자신의 삶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나 간호사가 내면의 이야기를 시로 풀어놓는 것은 자기실현의 방법이다. “돌같은 마음하나 씻기고 있는(〈江〉, 이혜영)” 간호사들의 시를 읽으며 희생과 사랑으로 생명을 품는 대지모신(大地母神)을 떠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